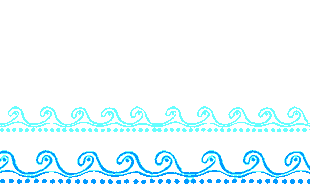 동지가 지나면 서서히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진다고 한다. 아직 밤기운이
걷히지 않은 아침을 헤치고 길을 나섰다. 채비라야 물통 하나에 낚싯대 하나
그게 다였다. 물론 물통에는 아무렇게나 뒤엉켜진 낚싯바늘과 봉돌, 조막만 한
가위가 뒹굴고 있었다. 마음의 바다는 멀리 있는데, 몸은 이미 기차에 실려가고
있었다. 낙동강을 따라 기차는 쉼 없이 달린다. 밀양, 삼랑진, 물금, 구포로 이
어지는 낙동강이 기차와 나란히 일정한 장단을 맞추며 웅장하면서도 도도히 흐
른다. 마치 도도히 흐르는 역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현대사의 온갖 구정물
을 마시고 토해내면서 시달리다 낙동강의 대역사 앞에 스스로 정화해서 조용히
달리는 듯하다. 낙동강은 주변의 비옥한 옥토를 적시고 산과 경계를 이루며 나
란히 남으로 달린다. 우리의 국토가 더 뻗어 태평양으로 달리고 싶건만 철마는
부산역에서 긴 하품을 하며 멈춘다. 무궁화든 ktx든 멈추지 않고 태종대, 오륙
도위를 지나 쓰시마섬까지 꿈에라도 달리고 싶다.
버스로 부산역에서 태종대까지는 사십 여분 걸린다. 영도다리 건너면 관광코스
처럼 해안가를 따라 길이 구불구불 이어진다. 멀리 부산 부두에 정박한 배와
크레인이 붉은 천을 휘두른 듯 생명의 뱃고동을 울리고 하나의 섬이 배움터가
되어버린 한국해양대와 그 너머로 오륙도가 눈앞에 다가올 듯 선명하게 보인다.
외지에서 온 듯한 삼삼 오오 남녀 군단이 신기한 듯 연방 바다 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웃음꽃이 핀다. 버스운전사도 웃음꽃을 피우느라 운전하면서도 관광해설
사처럼 태종대를 육성으로 안내한다.
태종대 버스 종착점 정류소 부근에 있는 낚시가게에 들렀다. 할머니가 반가이
맞는다. 단골가게가 된 지 오래되었다. 요즘 무슨 고기가 나오느냐고 물으니 학
꽁치가 나온다면서 새우미끼를 건넨다. 찬 바닷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태종대 자갈마당 주변 갯바위에 낚시꾼들이 점점이 서 있고 모래사장
이 아닌 자갈마당 가에는 관광객이 삼삼 오오 모여 바다와 호흡한다.
넓지도 길지도 않은 갯바위 주변에 십여 명 정도 서면 갯바위는 만원이 된다.
고등어나 학꽁치가 올라오는 시간에는 갯바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낚시꾼
들로 가득 찬다. 고등어는 보이지 않고 바다 표면에는 어린 학꽁치가 떼 지어
다닌다. 학꽁치 잡기에 꾼들의 눈이 붉다. 충혈된 눈으로 조그만 자리 양보도
없다. 어디서나 삶은 치열하다. 좁은 공간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 가끔 낚싯줄
이 뒤엉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바다 표면에 학꽁치가 떼 지어 은빛 물결
로 다가오지만 그림의 고기일 뿐이다. 낚시할 공간이 없다. 할 수 없이 한 발
자국 뒤에서 오늘은 바다를 조망한다.
갯바위 가로 유람선이 드나들고 멀리 뜬 배들이 꿈적 않고 일렬횡대로 지켜본다.
은빛 물결의 학꽁치가 낚시꾼의 바늘에 걸려 올라온다, 몸부림치는 학꽁치에 찬
란한 햇살이 산산이 부서지고, 바다는 잔파도를 일으키며 차갑고 거친 물 비늘
을 쏟아낸다. 거대한 바위 아래 울퉁불퉁 융기된, 바다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산화한듯한 갯바위에 선 낚시꾼들의 손놀림이 요란하다. 한쪽에서 학꽁치를 낚
아올리면 다른 쪽에서는 안달이 나는 모양이다. 연방 낚싯대를 두르고 한 손에
는 담배를 피우며 거친 바닷속을 뒤집는다. 맑고 아름다운 태종대 자갈마당에서
생활낚시를 하는 것은 좋으나 금연 팻말이라도 붙여놓는 게 좋을듯하다. 요즘 웬
만한 공공장소에는 금연이거늘 하물며 다수가 이용하는 풍광 좋은 장소에서 담배
연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유람선이 뜨는 계단 옆 갯바위에서 형제인듯한 두 사람이 나란히 학꽁치를 낚는다.
검은 안경을 쓴 형인듯한 사람이 연방 학꽁치를 낚아올리는 데 반해 옆에 선 동생
은 계속 허탕만 쳤다. 보다 못한 형이 가까이 다가가 채비를 점검한 후 학꽁치가
입질할 때 챔질을 잘해야 한다면서 동생의 낚싯대를 잡고 단번에 학꽁치를 낚아
올리며 미끼를 물면 바로 치면 잡히는데 그것 하나 잡지 못하느냐 핀잔을 준다.
바다는 고요하고 정적이 흐른다. 형이 채비를 이리저리 묶는 동안 이제는 동생이
신기하게도 연방 학꽁치를 낚아올린다. 형과 동생의 학꽁치 낚기가 순식간에 역
전이 되었다. 형제 옆에서 낚시하는 칠십 대로 보이는 낚시꾼은 지나가는 관광객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도 말없이 학꽁치를 낚기만 한다.
어른이 낚아채는 학꽁치는 이따금 춤을 추며 올라온다. 어정쩡하게 걸린 학꽁치가
바늘에서 떨어져 공중으로 한 바퀴 돌며 갯바위로 떨어진다. 더러는 바다로 떨어지
고 때론 유람선 선착장 계단으로 떨어지자 유람선을 타려는 자들의 동공이 커지며
몸부림치는 학꽁치가 갯바위로 미끄러져 내려가다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가기를 바
라며 저마다 한마디씩 지껄인다.
태종대 자갈마당을 가득 품은 숲과 바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정겹다. 스펙트럼
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햇살이 거친 파도 물 비늘을 뚫고 바다로 침투한다. 천장처럼
두른 숲 아래 자갈마당에는 조개와 횟감을 파는 천막 간이 식당이 있다. 매섭고 차
가운 바람이 부는 날에는 관광객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썰렁한 해녀 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아저씨" 하고 부르자 어떤 사람이 "왜요." 멈칫하며 응대한다. 거리가
좀 멀어도 해녀의 외침이 커서 그런지 바람에 실려 들리는 모양이다. "이리 오이소,
회와 조개 먹고 가이소" 외침이 파도와 부딪치는 자갈의 울음보다 더 크게 울린다.
바다는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았다가, 돌려보낸다. 바다의 고향은 바다가 아닐까?
낚시꾼도 관광객도 그들의 고향은 바다가 아니다. 바다는 그들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유희 판일지 모른다. 바다의 진정한 주인은 파도와 갈매기, 갯바위 물고기일 따름이다.
한치의 자리도 없는 갯바위 공간에서 바다를 조망하다 이내 자리를 털고 바다를 떠났다.
바다를 떠나면 다시 바다를 가고 싶은, 물고기의 감촉이 낚싯줄을 통하여 손으로 전달
되는 그 짜릿한 손맛을 잊지 못해 육지로 돌아오자마자 다음에 다시 어느 바다로 갈지
벌써 일기예보를 탐색하고 자주 접속하는 카페에서 물고기 조황을 들썩거려보는 낚시꾼
으로 중독되어버린 바다의 마력에 빠진 자에게, 바다는 영원히 머무를 수 없지만
언제나 가고 싶은 원초적인 마음의 고향인가!
동지가 지나면 서서히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진다고 한다. 아직 밤기운이
걷히지 않은 아침을 헤치고 길을 나섰다. 채비라야 물통 하나에 낚싯대 하나
그게 다였다. 물론 물통에는 아무렇게나 뒤엉켜진 낚싯바늘과 봉돌, 조막만 한
가위가 뒹굴고 있었다. 마음의 바다는 멀리 있는데, 몸은 이미 기차에 실려가고
있었다. 낙동강을 따라 기차는 쉼 없이 달린다. 밀양, 삼랑진, 물금, 구포로 이
어지는 낙동강이 기차와 나란히 일정한 장단을 맞추며 웅장하면서도 도도히 흐
른다. 마치 도도히 흐르는 역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현대사의 온갖 구정물
을 마시고 토해내면서 시달리다 낙동강의 대역사 앞에 스스로 정화해서 조용히
달리는 듯하다. 낙동강은 주변의 비옥한 옥토를 적시고 산과 경계를 이루며 나
란히 남으로 달린다. 우리의 국토가 더 뻗어 태평양으로 달리고 싶건만 철마는
부산역에서 긴 하품을 하며 멈춘다. 무궁화든 ktx든 멈추지 않고 태종대, 오륙
도위를 지나 쓰시마섬까지 꿈에라도 달리고 싶다.
버스로 부산역에서 태종대까지는 사십 여분 걸린다. 영도다리 건너면 관광코스
처럼 해안가를 따라 길이 구불구불 이어진다. 멀리 부산 부두에 정박한 배와
크레인이 붉은 천을 휘두른 듯 생명의 뱃고동을 울리고 하나의 섬이 배움터가
되어버린 한국해양대와 그 너머로 오륙도가 눈앞에 다가올 듯 선명하게 보인다.
외지에서 온 듯한 삼삼 오오 남녀 군단이 신기한 듯 연방 바다 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웃음꽃이 핀다. 버스운전사도 웃음꽃을 피우느라 운전하면서도 관광해설
사처럼 태종대를 육성으로 안내한다.
태종대 버스 종착점 정류소 부근에 있는 낚시가게에 들렀다. 할머니가 반가이
맞는다. 단골가게가 된 지 오래되었다. 요즘 무슨 고기가 나오느냐고 물으니 학
꽁치가 나온다면서 새우미끼를 건넨다. 찬 바닷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태종대 자갈마당 주변 갯바위에 낚시꾼들이 점점이 서 있고 모래사장
이 아닌 자갈마당 가에는 관광객이 삼삼 오오 모여 바다와 호흡한다.
넓지도 길지도 않은 갯바위 주변에 십여 명 정도 서면 갯바위는 만원이 된다.
고등어나 학꽁치가 올라오는 시간에는 갯바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낚시꾼
들로 가득 찬다. 고등어는 보이지 않고 바다 표면에는 어린 학꽁치가 떼 지어
다닌다. 학꽁치 잡기에 꾼들의 눈이 붉다. 충혈된 눈으로 조그만 자리 양보도
없다. 어디서나 삶은 치열하다. 좁은 공간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 가끔 낚싯줄
이 뒤엉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바다 표면에 학꽁치가 떼 지어 은빛 물결
로 다가오지만 그림의 고기일 뿐이다. 낚시할 공간이 없다. 할 수 없이 한 발
자국 뒤에서 오늘은 바다를 조망한다.
갯바위 가로 유람선이 드나들고 멀리 뜬 배들이 꿈적 않고 일렬횡대로 지켜본다.
은빛 물결의 학꽁치가 낚시꾼의 바늘에 걸려 올라온다, 몸부림치는 학꽁치에 찬
란한 햇살이 산산이 부서지고, 바다는 잔파도를 일으키며 차갑고 거친 물 비늘
을 쏟아낸다. 거대한 바위 아래 울퉁불퉁 융기된, 바다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산화한듯한 갯바위에 선 낚시꾼들의 손놀림이 요란하다. 한쪽에서 학꽁치를 낚
아올리면 다른 쪽에서는 안달이 나는 모양이다. 연방 낚싯대를 두르고 한 손에
는 담배를 피우며 거친 바닷속을 뒤집는다. 맑고 아름다운 태종대 자갈마당에서
생활낚시를 하는 것은 좋으나 금연 팻말이라도 붙여놓는 게 좋을듯하다. 요즘 웬
만한 공공장소에는 금연이거늘 하물며 다수가 이용하는 풍광 좋은 장소에서 담배
연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유람선이 뜨는 계단 옆 갯바위에서 형제인듯한 두 사람이 나란히 학꽁치를 낚는다.
검은 안경을 쓴 형인듯한 사람이 연방 학꽁치를 낚아올리는 데 반해 옆에 선 동생
은 계속 허탕만 쳤다. 보다 못한 형이 가까이 다가가 채비를 점검한 후 학꽁치가
입질할 때 챔질을 잘해야 한다면서 동생의 낚싯대를 잡고 단번에 학꽁치를 낚아
올리며 미끼를 물면 바로 치면 잡히는데 그것 하나 잡지 못하느냐 핀잔을 준다.
바다는 고요하고 정적이 흐른다. 형이 채비를 이리저리 묶는 동안 이제는 동생이
신기하게도 연방 학꽁치를 낚아올린다. 형과 동생의 학꽁치 낚기가 순식간에 역
전이 되었다. 형제 옆에서 낚시하는 칠십 대로 보이는 낚시꾼은 지나가는 관광객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도 말없이 학꽁치를 낚기만 한다.
어른이 낚아채는 학꽁치는 이따금 춤을 추며 올라온다. 어정쩡하게 걸린 학꽁치가
바늘에서 떨어져 공중으로 한 바퀴 돌며 갯바위로 떨어진다. 더러는 바다로 떨어지
고 때론 유람선 선착장 계단으로 떨어지자 유람선을 타려는 자들의 동공이 커지며
몸부림치는 학꽁치가 갯바위로 미끄러져 내려가다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가기를 바
라며 저마다 한마디씩 지껄인다.
태종대 자갈마당을 가득 품은 숲과 바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정겹다. 스펙트럼
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햇살이 거친 파도 물 비늘을 뚫고 바다로 침투한다. 천장처럼
두른 숲 아래 자갈마당에는 조개와 횟감을 파는 천막 간이 식당이 있다. 매섭고 차
가운 바람이 부는 날에는 관광객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썰렁한 해녀 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아저씨" 하고 부르자 어떤 사람이 "왜요." 멈칫하며 응대한다. 거리가
좀 멀어도 해녀의 외침이 커서 그런지 바람에 실려 들리는 모양이다. "이리 오이소,
회와 조개 먹고 가이소" 외침이 파도와 부딪치는 자갈의 울음보다 더 크게 울린다.
바다는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았다가, 돌려보낸다. 바다의 고향은 바다가 아닐까?
낚시꾼도 관광객도 그들의 고향은 바다가 아니다. 바다는 그들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유희 판일지 모른다. 바다의 진정한 주인은 파도와 갈매기, 갯바위 물고기일 따름이다.
한치의 자리도 없는 갯바위 공간에서 바다를 조망하다 이내 자리를 털고 바다를 떠났다.
바다를 떠나면 다시 바다를 가고 싶은, 물고기의 감촉이 낚싯줄을 통하여 손으로 전달
되는 그 짜릿한 손맛을 잊지 못해 육지로 돌아오자마자 다음에 다시 어느 바다로 갈지
벌써 일기예보를 탐색하고 자주 접속하는 카페에서 물고기 조황을 들썩거려보는 낚시꾼
으로 중독되어버린 바다의 마력에 빠진 자에게, 바다는 영원히 머무를 수 없지만
언제나 가고 싶은 원초적인 마음의 고향인가!


